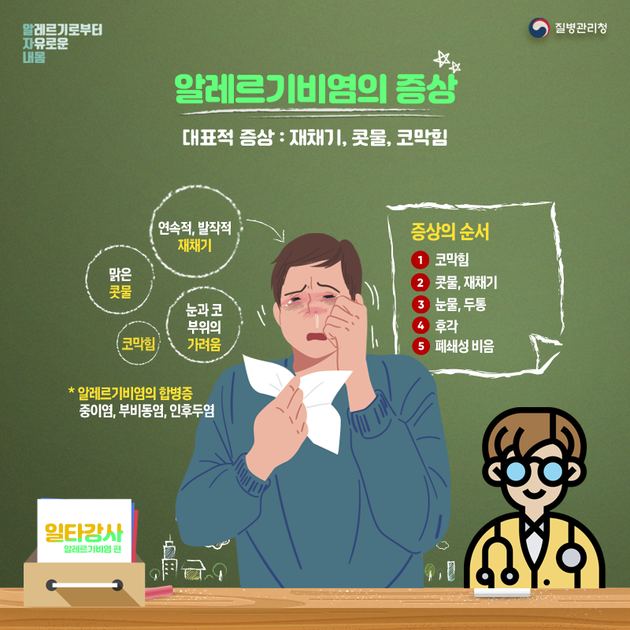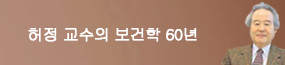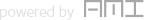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서양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의사와 한의사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서양의학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 우리는 전통적으로 국민의 삶과 궤를 같이 해 온 한의학을 발전시켜 왔다. 이는 중국과 일본 등 한자 문화권에서 생성된 동양의료의 한 축으로 동양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서양의학은 조선 말기에 국내에 들어왔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으로 꼽는 광혜원은 1885년 서울 재동에서 문을 열었다. 미국인 의료선교사인 알렌(Horace. N. Allen)에 의해서다. 이때부터 130여년이 흘렀다. 그간 서양의료는 끊임없이 발전했고 국내 의료수준은 선진국도 부러워할 만큼 성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의원(한방병원)에 간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역할론은 해묵은 논쟁으로 이어져 왔다. 직역싸움이 끊이질 않았고 그로 인한 반목도 잦았다. 최근에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쟁으로 불이 옮겨 붙어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양의사’라는 명칭을 놓고도 맞다 틀리다, 신경전이 거세다.
이런 와중에 한의사와 치과의사들이 ‘의료계(醫療界)에는 양의사만 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6일 “‘의료계’라는 명칭은 양방의료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나선 것이다. 양 단체는 의료법 제2조 1항을 근거로 ‘의료계는 양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모두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어쨌든 사전 속 의료계는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분야’라고 나와 있다. 의료법에 더해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들 양 단체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명칭보다 중요한 건 의사로서의 본분이고 자질이다. 양의건 한의건 간에 의료인은 모두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만 의사라는 오만도 불편하고 너만 의사냐며 따지고 드는 것도 볼썽사납다. 국민에게는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쳐질 뿐이다. 서로의 직역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라야 우리 국민들도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가질 수 있다. 갈등보다는 화합이, 악의보다는 선의의 경쟁이 필요한 때다.
김혜란 편집국장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