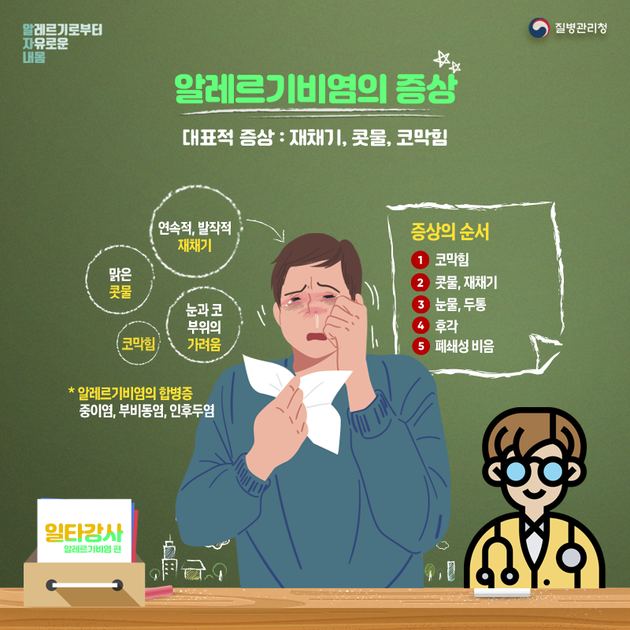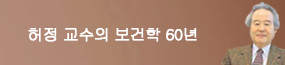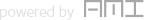휴일이나 야간에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는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23~24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평일은 밤 23시까지, 토·일요일은 18시까지 진료하며 당시 6개 시도의 8개 병원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는 지난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전국 30개 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의료계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하려면 전문의 3명이 있어야 하는데, 동네 병의원들은 절대 지정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며 "이로 인해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과병원계의 '대형마트'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소아과들은 1인 개원의가 운영하는 곳이 많아 휴일·야간진료를 진행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결국 복지부의 사업 확대는 실패로 돌아갔고 전국에 달빛어린이병원은 15곳에 그쳤다.
그마저도 4개 기관은 운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으면서 현재는 11곳만 남았다. 수도권에는 경기도 용인과 평택 단 두 곳만 운영 중이다.
이에 복지부는 1인 개원의가 장시간 야간·휴일 진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료계의 지적을 반영해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모델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하는 이유도 일리는 있다. 가뜩이나 환자들이 몰리는 대형병원에서 휴일과 야간진료까지 더해 환자들을 빼앗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달빛어린이병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동네 소아과나 병의원이 문을 닫으면 부모들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향해야만 한다. 국민 건강과 환자 편익이 우선이라는 점에서는 의료계의 반대 명분도 그 힘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의사들의 참여만 강요하는 정책은 실효성 논란만 부를 뿐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은 정부주도형 모델이자 복지부의 일방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헤아려야 한다.
국민들이 환영하는 정책이라고 해도 의료계의 협조 없이는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명심할 일이다. 강경일변의 엄포 정책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의료계와 소통 가능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기대한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