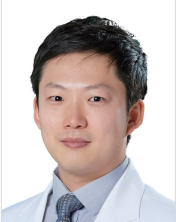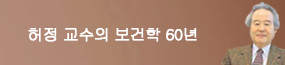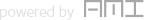사문화 된 낙태금지법에 대해 복지부는 '처벌강화'라는 해결책을 내놨다. 낙태금지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9월2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의사의 자격 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의료계와 여성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의해 지난 11월2일 현행 1개월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의료계는 낙태를 비도덕적 행위에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의사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으며,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해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다른 처벌 대상인 여성들 역시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분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낙태금지법이 현실을 반영한 법인지,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입법적 미비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낙태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정부의 시도가 올바른 것이었을까.
특히 정부는 낙태를 막으면 출산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계획도 갖고 있다. 과연 세계 최하위권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낙태금지법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방안이 올바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물론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낙태 시술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낙태는 가능한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도 사문화한 불법 낙태 수술을 처벌 규정만 강화한다고 해서 줄어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점이다.
또 임신, 출산, 양육의 당사자인 여성들의 입장을 불사하고 국가의 인구 증가를 꾀할 수단으로 낙태금지법을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강력한 법적 단속이 이뤄지면 오히려 여성들은 낙태가 허용되는 곳을 찾아 떠나는 원정낙태, 또는 더욱 음성적이고 위험한 조건에서 낙태를 하게 될 것이다.
미혼 임신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는 분명하고 당연하다. 사회적 냉대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 경제적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는 무조건적인 낙태 단속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진정 낙태를 근절하고 인구 증가를 도모한다면 낙태를 징벌적 단속의 대상이 아닌 여성 건강 보호와 저출산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출산과 양육의 당사자들의 심중을 헤아려 그들 스스로가 출산과 양육을 원하도록, 또 비혼 출산 여성을 따뜻이 품을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