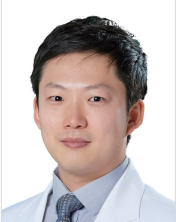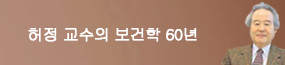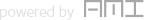어느덧 국산 27호 신약이 출시되고 국내 제약시장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는 얘기가 들려오지만, 국내 제약사들에 붙은 ‘수입약 유통업자’라는 딱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제약산업을 이끄는 대형 제약사들부터가 수입약 수입·판매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한양행과 제일약품의 경우 전체 매출의 70% 가량을 타 회사 품목(주로 수입약) 판매에서 올리고 있다.
수입약 판매는 당장은 win-win 관계로 보일 수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수백억 매출이 보장되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팔아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사가 구축한 영업 인프라를 활용해 손쉬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 이는 제약산업 초기, 국내 제약사들의 성장을 위한 발판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 제약산업 환경이 크게 향상된 지금도 수입약 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은 당장의 잿밥에 급급한 근시안적 시각이다. 제약사에 있어 수입약 매출 비중이 높은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에게 손실을 가져다주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 역시 저해한다.
실제로 수입약 판매 비율이 높은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 제약사들의 행보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경우가 많다.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 시 오리지널 의약품 유통에 의존하던 국내 제약사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드물게는 판권 계약 여부에 따라 업체 간의 판도가 변하기도 한다. 경쟁사가 판권을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굴욕적 계약까지 서슴치 않는 국내 제약사들의 행보를 보면 씁쓸함마저 느껴진다.
이는 최근 국내 개발사들의 매출은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이른바 ‘헛장사’ 현상과도 관계가 없지 않다. 국내 제약사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유한양행은 올해 3분기까지 964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이 중 74% 가량이 수입약 유통을 포함한 상품 매출이다. 10위권 제약사들의 실적을 살펴봐도 수입약을 비롯한 상품 판매 비중은 평균 40%가 넘는다.
제약업계 발전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구조는 수입약 판매 수익으로 얻은 수익을 신약 R&D에 쏟는 것이다. 비록 R&D 투자 열풍은 지난 9월 한미약품 계약파기 사태 이후 다소 주춤한 분위기지만, 상위 기업 중심으로 이전보다 R&D 투자 비율이 확연히 늘어났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다.
류종화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