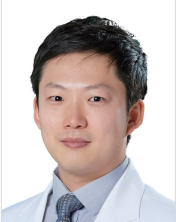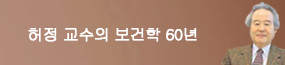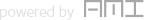한 사람의 사고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가족에게도 고통이 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부담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하여 보통은 보험을 가입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시 장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가입했지만, 막상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기대와 다른 보상에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 사람의 사고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가족에게도 고통이 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부담으로 올 수 있다. 이런 사고를 대비하여 보통은 보험을 가입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시 장래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가입했지만, 막상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는 기대와 다른 보상에 불만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이런 상황의 민원을 대할 때 가장 무력감을 느끼곤 한다. 보험의 문제이지만 의료의 전문적 영역으로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의료 전문지식이 부족한 필자로서는 도움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고 피해자와 보험사의 이해 충돌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많다는 점에서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최근 ‘장애 분류표’ 개정안 초안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2년만에 나온 것으로 그 동안 이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감안 하면 늦은 감이 있다. 신체 장애 평가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사고 피해자가 입원 치료한 병·의원의 장애 진단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가 의료 기록으로 선정한 의사에게 의료 자문을 받아, 그 결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다. 문제는 사고자를 판단한 의사와 보험사의 자문의가 같은 전문의 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다른 결과라는 것이다.
현재의 장애분류는 정의가 모호하거나, 판단 기준 미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의료계가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도입·보완하여 의료계의 객관성을 보여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007년 대한의학회는 한국형 장애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논의를 거쳐 2010년 6월 확정했다. 하지만 실무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현재 장애판정과 관련하여 법원은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1936년도의 미국 제도를 사용하는가 하면, 보험사는 12년 전의 불완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제는 의료계가 나서 공정하고, 누구나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장애평가 기준의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의료계의 노력과 함께, 장애분류표를 주기적으로 개선·규정함으로서 새로운 환경에 맞도록 노력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쟁기구를 설립하여 장애로 고통받고 억울하게 평가받는 피해자가 없었으면 한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