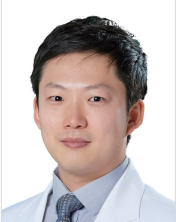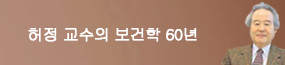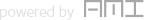요즘에는 쌀이 무슨 애물덩어리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든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 정책이 남아도는 쌀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5~60년대, 보릿고개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먹을 것이 귀했던 당시와 비교하면 아니러니 하기만 하다. 그 시절 ‘혼식 장려운동’이 있었다. ‘혼식’이란 혼자서 식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잡곡과 섞여진 밥을 뜻한다. 당시 담임선생님은 혼식 여부를 확인하느라 매일처럼 도시락 검사를 했다. 그때는 흰쌀밥이 사치였다. 어머니는 밥을 지을 때 흰쌀 위에 보리쌀을 올리곤 했다. 아랫부분 흰쌀밥은 아버지 몫이었고 나머지 쌀과 보리가 섞인 밥은 우리 차지였다.
최근 정부는 쌀 시장의 과잉상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여의도 120배 규모인 3만5000ha의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별로 목표 면적을 설정해 감축 실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매입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구상이다.
얼마 전에는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한다는 목표 아래 쌀전업농, 쌀생산자협회, 들녘경영체, 농촌지도자 등 4개 농업인 단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3저3고 의식전환운동’ 추진결의대회도 가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운동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단체장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서 “농업인단체와 함께 함으로써 쌀 산업의 지속적 유지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농민들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정부가 목표로 한 재배면적을 줄였을 경우, 쌀 생산 감축효과는 약 18만3천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쌀 재고량 236만톤의 7.8%에 불과한 양이다. 더구나 매년 30만톤의 쌀이 과잉생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부의 목표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한 듯하다. 물론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설령 이번 운동으로 성공한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쌀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를 계기로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 함께 고민해 보고 의미가 담겨있을 것이다.
지금의 구조로는 쌀 과잉문제가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설령 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어느 정도 보전해 주기 때문에 판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있다. 더불어 다른 작물에 비해 자동화가 꽤 진척되어 있는데다 가격 등락폭 또한 그리 심하지 않아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다른 작물로 갈아타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결국 쌀 소비량을 늘리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 1986년 127.4kg을 정점으로 30년 동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지난해 61.9kg으로 반토막이 났다. 2002년 모 방송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화제를 모았던 ‘아침밥 먹기 프로젝트’와 같은 거국적인 對국민 캠페인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강성기 부국장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