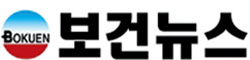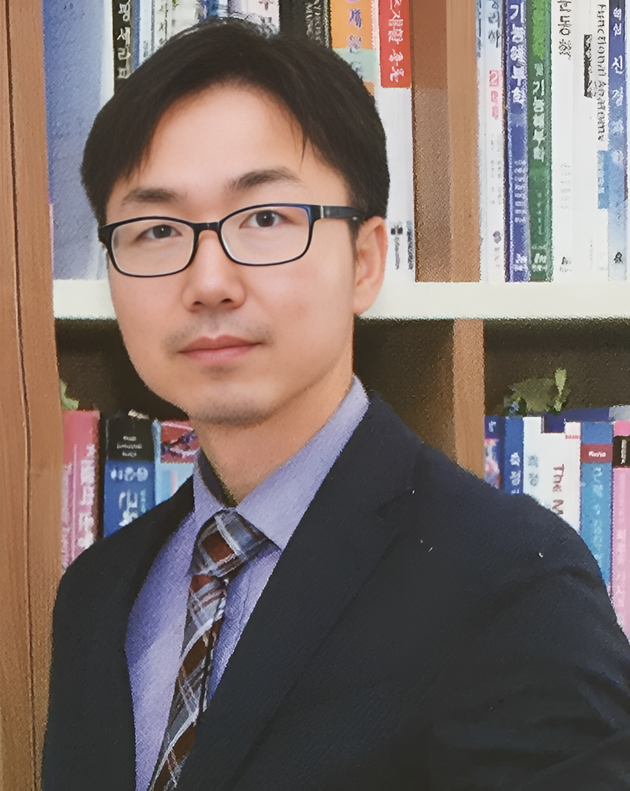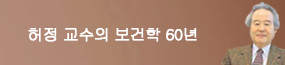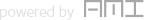"안전성 평가제도, K-뷰티 국제 신인도 높이는 계기 될 것"
식약처 화장품 정책 간담회… 고지훈 화장품정책과장 제도도입 필요성 강조
영세업체 많은 국내 화장품 산업 특성상 자체적인 대응역량 부족 문제로 지적
장기 로드맵 공개… 올해 화장품법 개정, 2028년 단계 시행, 2031년 전면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9일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에서 화장품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필요성과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책임판매업자가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 중국, 유럽을 비롯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소비자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대한화장품협회와 관련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제도 도입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화장품산업 특성상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수출은 102억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20.6%가 증가하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55억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지훈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장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K-뷰티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제적인 신인도 제고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소비자 안전을 확대하고 산업 안전역량을 강화하며 국가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에 맞춘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은 더 이상 미룰수 없는 과제라는 것.
실제 지난해 K-뷰티의 수출 상위 10개국 중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일본(수출 3위), 홍콩(4위), 러시아(6위)를 제외한 중국(1위), 미국(2위), 베트남(5위), 대만(7위), 태국(8위), 아랍에미리트연합(9위), 싱가포르(10위) 등 7개국이다.
하지만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국내 화장품산업 특성상 업계의 자체적인 대응역량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국내 화장품 업체 중 생산실적 10억원 미만이 94%(1만1088개사)가 넘고, 연구인력이 없는 곳도 72%(8486개사)나 된다(2023년 기준).

이에 따라 식약처는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운영을 위해 6년간의 장기 로드맵을 공개했다. 글로벌 규제 조화·안전성 평가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과 함께 국식내 화장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연도별 세부 추진 내용은 △2025년: 화장품법 개정, 시규·고시·가이드라인 안전성 평가제도 제도화 기반 마련 △2026~2027년: 시범사업과 유예기간 △2028~2030년: 연간 생산·수입 실적 10억원 이상 업체와 신규 품목부터 단계 시행 △2031년: 전체 업체와 품목으로 전면 확대로 요약된다.
우선 식약처는 지난 6월 30일 강선우 의원에 의해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을 올내 추진하고 △국내외 원료 안전성 정보 DB 구축 △원료 안전성 평가 및 위해 평가 수행·결과 배표 △제품 안전성 평가 컨설팅과 상담창구 운영 △전문기관 지정과 전문가 양성 등 안전성 평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신규원료 증가, 제품의 다양화와 사용연령 확대 등에 따라 높아진 소비자 기대수준에 맞춰 안전관리 체계 선진화는 필요하지만, 개별 일회성 지원보다는 전체 산업 역량과 국가 신인도 향상을 통한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유럽(2013년부터 업체 책임자(RP)를 대상으로 화장품 제품정보파일(PIF)과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의무화) △중국(2025년 5월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전면 시행, 화장품 등록·허가 시 각 성분의 안전성 평가를 포함하는 제품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 △미국(2022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을 제정, 2024년 7월 본격 시행) △대만(2019년 7월 화장품위생관리법을 제정, 품목별 단계적 의무화 추진 중) 등 국제규제와 조화를 맞춰야 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있다.
고지훈 과장은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은 궁극적으로 국가 간 상호인정이 목표"라며 "유럽, 중국, 미국 등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조화를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이견을 좁혀 나가겠다"며 "제도 도입 전 시간을 두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