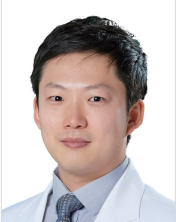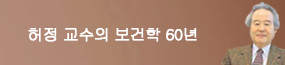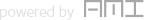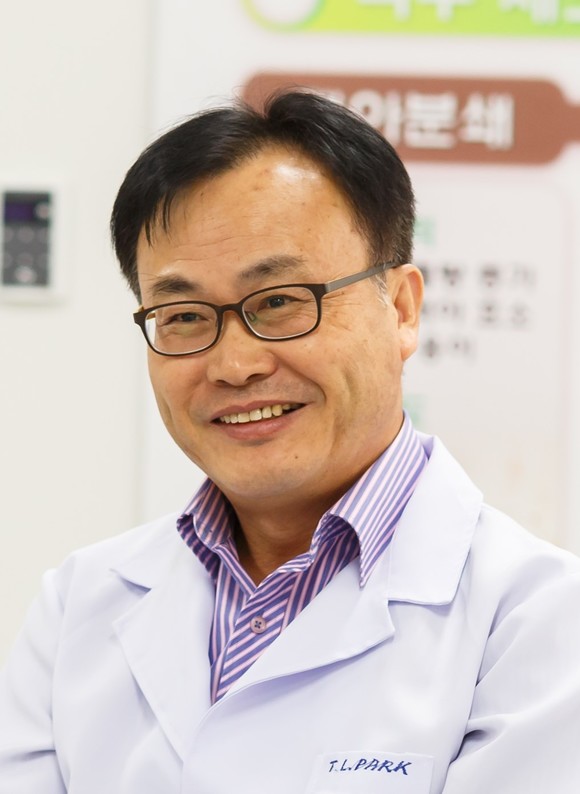
식빵에 잼을 발라 달걀 샐러드 샌드위치로 아침 식사하고 점심에는 면을 즐기는 식문화가 일상화된 지 오래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잠이 부족해 시간에 쫓기다 보니 국과 반찬 준비가 필요한 밥보다 간편식을 찾는다. 이를 입증하듯이 밀은 국내 일인당 연간 소비량이 2019년 평균 33kg으로 쌀 소비(59.2kg)가 감소하는 추세와는 달리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쉽게 표현하면 현재 하루 세끼 중 한 끼는 밀로 만든 식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와 더불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간편식의 소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점은 주지할 일이다.
2018년 기준 우리 국민 1인당 밀가루 소비량은 연간 32.2kg으로, 주식인 쌀에 이어 2번째로 소비량이 많다.
하지만 현재 국내 밀 자급률은 1% 내외로 지난해만 해도 240만톤의 밀을 수입했다. 국내 밀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에서 명맥만 이어오다가 최근 밀 소비 증가로 인한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자급률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밀산업육성법’이 발의돼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밀의 수입 상황으로 볼 때 국산 밀이 비집고 들어가기란 솔직히 버겁다. 따라서 국산 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핵심 문제 위주로 풀어가야 한다.
첫째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수입밀과의 가격 차이다. 3~4배의 국제 가격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입밀과 차별화하는 수밖에 없다. 기존 품종과 차별화된 기능성, 영양성이 높은 품종 개발은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가격 차이 극복과 함께 밀을 역수출 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품질 향상을 통한 국산밀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 국산 밀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자 용도에 맞게 개선해 수입 밀에 버금가거나 우수한 품질향상을 기본으로 실제 이용하는 가공업체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수량성과 내재해, 내병성을 강화해 재배의 안정성도 겸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세 번째로 가공업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균일한 품질의 안정적인 생산기술을 조성함으로써 가공업체가 마음 놓고 국내산 밀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된 원료의 품질을 등급별로 수매할 수 있는 기준 설정과 용도별 블렌딩 기술을 확립하고 수확 후 철저한 품질관리 체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신품종 3종을 개발했다. ‘황금밀’은 단백질 함량이 14%에 이르는, 끈기가 풍부한 초강력분으로 빵을 만드는 데 최적화된 품종이다.
‘오프리(O-free)’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핵심 물질인 ‘오메가-5-글리아딘’이 없는 품종이다. 세계 최초로 유전자변형(GMO)이 아닌 인공교배를 통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없앴다. 국민의 6%가 밀 알레르기 환자로 알려진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특히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리흑’은 높은 항산화 기능성으로 주목을 끄는 품종이다. 안토시아닌·탄닌·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기존 밀보다 10배나 더 들어 있으며, 비타민 B1, 비타민 B2, 칼슘, 철, 아연 등 다른 무기질 성분도 풍부하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술개발의 역할이 뒷받침돼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수입밀과 차별화된 기능성 밀을 개발해 국산 밀의 자급률을 높이고,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밀연구팀’을 신설해 밀 품종 육성과 품질 향상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 밀 소비가 더욱 많아질 것을 대비해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재배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공급과 부가가치 제고기술 개발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밀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필수 에너지 공급원이 됐다. 이제 밀은 식량주권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다음 세대는 “아침에 빵 드셨습니까?”로 인사할지도 모른다.

이원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