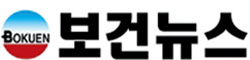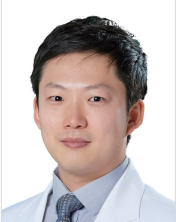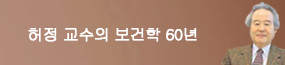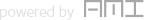일본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 동남아시아를 묶어 ‘대동아공영권’이라고 불렀다. 서로 공영하자는 취지로 오늘날의 아세안과 비슷하다. 그러나 일본의 원래 의도는 서로 공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제패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던 것이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원자재가 거의 없다. 석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자재는 주로 동남아에서 얻을 수 있고, 그나마 석유도 미국의 눈치를 보며 공급받는 상황이었으므로 동남아는 일본경제의 생명선과 같았다. 미국이나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했던 원자재들을 당시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등에서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열대지역 전쟁에 필수적인 약이 바로 ‘키니네’이고, 키니네의 원산지도 바로 동남아였다.
오늘날에도 열대지방에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항말라리아약이다. 당시 미국이나 영국도 키니네 없이는 열대지방에서 활동이나 전쟁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그 후 미국과 영국에서 합성신약 ‘아타블린’이 개발됐고 키니네를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세계 전쟁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1차 세계대전까지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원인을 살펴보면 전사(戰死)보다 병사(病死)가 훨씬 많았다. 이런 현상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것이 발진티푸스를 막을 수 있는 DDT와 악조건에서도 전투를 수행케 했던 아타블린이다.
비극적인 한국전쟁에서도 전사자보다 병사자가 많았지만, 그 통계는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6.25 전쟁 중 큰 파장을 일으켰던 국민방위군 사건은 고위층의 부정착복이 원인이었다. 하지만 당시 국민방위군으로 남하했던 수많은 젊은이들은 엄동설한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득실거리는 이로 인한 발진티푸스 때문에 죽어갔다.
9.28수복 이후 서울에선 전차 정류장마다 미군들에 의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얗게 DDT가루가 뿌려진 사람들이 많았다. 몸속에서 기생하는 이를 죽여 겨울철 다발했던 발진티푸스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필자도 전차를 타고 학교에 다녔다. 전차를 타려면 의례 DDT가 온몸에 뿌려졌던 기억이 난다.
또 여름에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가 잠복해서 아타블린을 장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여러 가지 부작용과 잔류기간이 길어 이제는 DDT를 사용하지 않지만 아타블린은 항말라리아약으로 아직도 쓰이고 있다. 아타블린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국의 훌륭한 발명품이었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