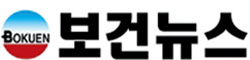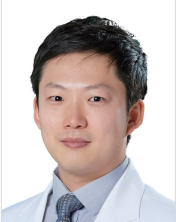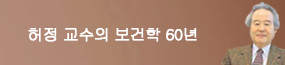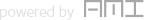내년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도입을 앞두고 제도의 시행조차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가운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홍보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소비기한의 도입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 유통기한으로 착각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섭취했을 때 안전문제 등 소비자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소비자와의 소통을 늘리고, 소비기한의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품에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기재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명서 전문]
1985년부터 시행된 '유통기한 표시제'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소비기한 도입은 폐기량 감소, 품질안전한계기간(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 증가 등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소비기한의 도입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혼란이 불가피하다. 또 유통기한으로 착각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섭취했을 때 안전문제 등 소비자피해도 우려된다.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소비자에게 소비기한의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품에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기재하는 등 부작용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소비기한'은 식품이 제조돼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이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까지의 60~70% 지점인 것과 달리 소비기한은 80~90% 지점으로 정해져 섭취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이 제도는 기존 유통기한으로 인해 음식 폐기량이 많아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처음 고안됐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t, 처리비용은 1조960억원 정도다. 소비기한 도입으로 폐기량이 줄면 소비자는 연간 8천860억원, 산업체는 260억원의 편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이달 초 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발표했다. 과자는 유통기한 45일에서 소비기한이 81일로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80%)을 보였다. 이외에도 과채 음료가 11일에서 20일(76%), 두부가 17일에서 23일(36%), 빵류가 20일에서 31일(53%)로 증가하는 등 소비자들이 즐겨 먹는 제품들의 기한이 대폭 증가했다.
문제는 소비자와의 소통이 부족해 소비자들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연구팀에서 소비기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의 52.9%는 마트 등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사서 먹겠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6.2%에 불과했다. 유통기한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를 정확히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비기한을 유통기간처럼 착각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섭취할 가능성이 크다.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품의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섭취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앞서 발표한 80개 품목 외에 460여 개 품목의 참고값도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다는 목적이나, 내용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가 소비기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비자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 식약처는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제품별로 소비기한의 명확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크고 선명하게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입장에서 피해를 예방하고, 식품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 안착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원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