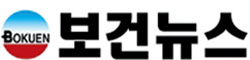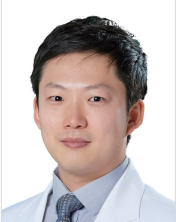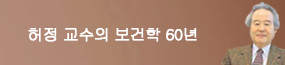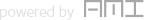비소세포폐암 시장에 ALK, EGFR 등 주요 변이를 타깃 하는 표적항암제들이 출시되며 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다. 특히 ALK 유전자 변이에서는 2세대 표적치료제인 알룬브릭(브리가티닙)이 뇌전이 환자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보이며 환자들의 예후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장승훈 교수를 만나 ALK 비소세포폐암 표적 치료 현황과 최신 치료 지견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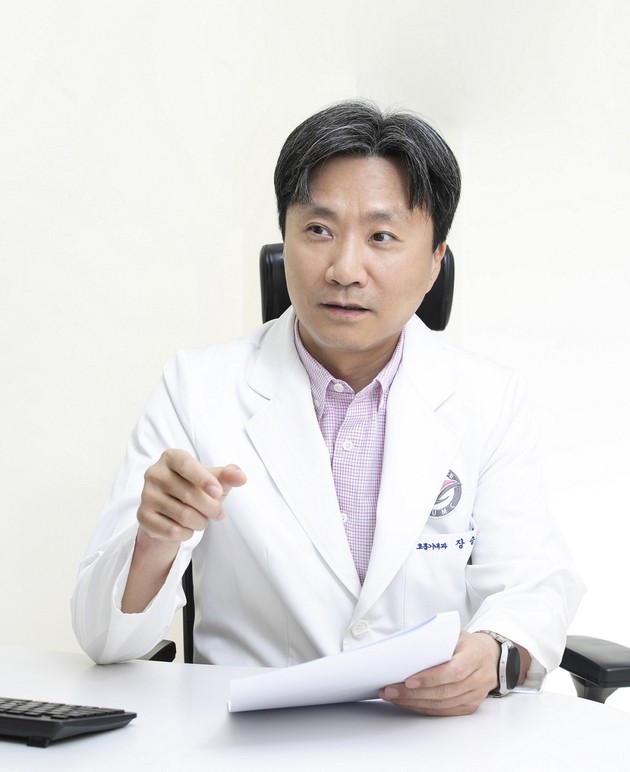
-ALK 변이의 특성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린다.
대부분의 폐암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한다. 표적항암제가 개발되어 있는 폐암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돌연변이가 EGFR이고, 두번째가 ALK이다. ALK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경우는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에서 3~8% 정도 수준이다. 0.5~1% 수준의 발생률을 보이는 유전자 변이도 많기 때문에 ALK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 수가 적은 편은 아니다. 유전자 변이를 타깃 하는 표적항암제가 개발되면서, 항암 화학요법으로 치료할 때보다 치료 반응, 예후, 생존기간 등이 대폭 개선되었다.
-과거와 비교할 때 표적항암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표적항암제가 없던 시절에는 진행성 폐암 환자 평균 수명이 1년 내외였지만, 표적항암제 덕분에 생존기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최근 생존기간 중앙값은 EGFR 변이가 2.5~3년, ALK 변이가 4~5년 정도이다. 표적치료가 가능한 선암 중에서는 ALK 변이 생존기간이 가장 길다.
-폐암 치료에서 뇌전이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진행성 폐암 환자들에게 뇌전이의 발생 빈도가 높다. 특히 발생률이 높은 EGFR, ALK 변이에서 뇌전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뇌전이 발생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는데, 해당 유전자 변이 자체가 뇌전이를 촉발하는 성질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치료 효과가 좋은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면서 생존기간이 길어졌고, 암 세포가 뇌에 전이될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더 많아진 것도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른 장기보다 뇌가 전이에 더 취약한 것인지.
취약한 편이다. 암이 진단되면 항암제를 사용하는데, 환자 몸에 투여된 항암제는 혈액을 타고 다니다가 암 세포를 만나면 그 암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 많은 장기들이 항암제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뇌에는 항암제가 충분히 들어가지 못해 전이에 취약해진다. 정상적인 신체 조직에서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 쪽으로는 다른 물질이 투과되지 못하게 장벽을 쌓는 혈액-뇌-장벽(Blood-Brain-Barrier; BBB)이 있기 때문이다. 혈액 속 물질이 뇌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 뇌전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항암제로 치료하더라도 반응율이 떨어진다. 하지만 알룬브릭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신 약제들은 혈액-뇌장벽을 통과하는 침투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알룬브릭의 뇌전이 관련 데이터가 올해 ASCO에서 발표되었다고 들었다. 데이터를 설명해주신다면.
ASCO에서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알룬브릭이 뇌전이 환자에서 두개내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edian iPFS) 44.1개월, 치료 2년 시점의 두개내 무진행생존율 69%에 달하는 결과를 확인하며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아시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J-ALTA 연구의 하위 분석 결과에서도 확정 객관적 반응율(Confirmed ORR) 97%, 뇌전이 환자들의 치료 2년 시점 iPFS 77% 등의 좋은 결과가 확인됐다.
예전에는 폐암 환자를 치료하다가 뇌전이가 발견되면 거의 말기로 여겨졌다. 잔여 생존기간을 3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정도로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뇌전이 효과가 우수한 표적항암제가 출시되면서 뇌전이에도 극적인 약효를 보일 수 있게 되었다.
-진료현장에서 체감하는 알룬브릭의 치료 이점은 무엇인가?
암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이 환자를 얼마나 오래 살릴 수 있는지, 환자들에게 약 부작용은 없는지, 환자가 느끼는 복약편의성은 어떤지 등을 고려한다. 알룬브릭 등 현재 출시된 ALK 2세대 표적항암제들의 생존기간 통계는 거의 유사하다. 부작용 또한 약제마다 차이는 있지만, 어떤 게 더 좋고 나쁘다 할 것 없이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알룬브릭은 1일 1회 1정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해 복약편의성 면에서 강점이 있다.
항암제가 아무리 발전되었다고 해도, 항암제는 항암제이다. 소화제처럼 속이 편할 수는 없다. 항암제를 복용하면 뭔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용해야 되는 알약 개수나 횟수가 많을 경우 환자가 복약지도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줄여서 복약 하는 경우가 있다. 저녁 약을 아예 빼먹거나, 알약 수를 적게 먹는 식이다.
그렇게 하면 금방 내성이 생겨 증상이 나빠질 수 있다. 환자가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어도 일단 X-ray에서 결과가 나쁘다면 건강보험급여 기준으로는 내성이 생긴 것으로 판단해 약 처방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환자는 같은 약으로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고 다른 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알룬브릭은 하루에 한 알만 먹기 때문에 환자가 임의로 복약 용량을 조절할 수 없다. 의료진이 계획한 치료 방향에 맞춰 환자와 치료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환자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전하신다면.
처음 폐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은 절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요즘은 폐암이라고 다 똑같은 암이 아니다. 유전자 분석으로 치료법을 세분화하기 때문에 예후도 치료법에 따라 서로 다르다. ALK 변이는 여타 폐암보다 예후가 매우 좋은 편이고 좋은 치료제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ALK 돌연변이는 거의 완치할 수 있는 암이라고도 말한다. 폐암이라고 해서 시한부 인생이라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과, 치료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요즘은 굉장히 오래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좋은 치료제들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과 최선의 치료법을 상의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전할 말이나 정책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출시되는 신약들이 비싸기 때문에 좋은 약이 있어도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환자들이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정부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좋은 약, 좋은 치료법은 빠르게 급여 허가를 해주었으면 한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