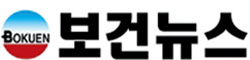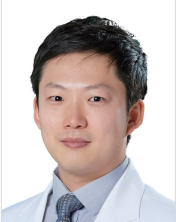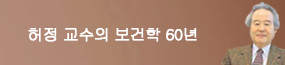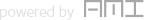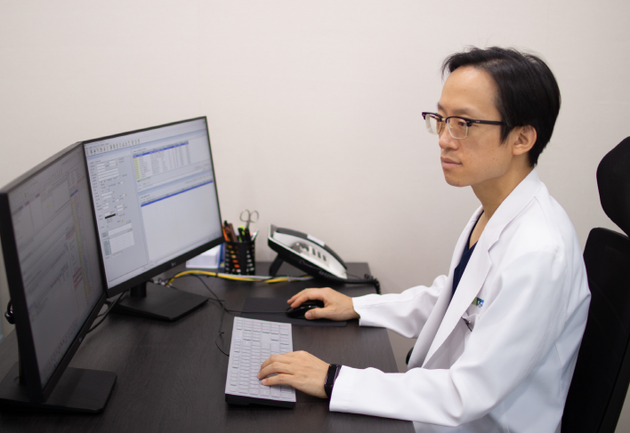
신장, 즉 콩팥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신부전이라 한다.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된다. 급성 신손상은 신우신염, 신장염 등 감염증이나 약물, 독극물, 혈액량 부족, 저혈압, 신전성 저혈압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상당히 위험하지만 초기 처치를 잘하면 만성으로 가는 일은 드문 편이다.
콩팥의 기능이 빠르게 저하되면서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급성 신손상이라 한다. 이 상태에서 더 진행돼 기능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저하됐다면 만성으로 정의한다. 고혈압, 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신우신염, 신장염 등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을 때 생기기도 한다.
이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혈액투석을 받아야 한다. 매우 위험한 상태인데 대한민국에서는 말기 신장 기능 상실로 인해 3개월 이상 지속적인 투석을 받고 있는 경우 신장장애 2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한다.
본래 신장은 체내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몸 안에 요독이 그대로 남아 전신적인 병증을 일으키게 된다.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자율신경계, 체액, 전해질, 피부, 심혈관계, 소화기계, 혈액, 내분비계, 면역계 등 모든 기능에서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
따라서 한 번이라도 신우신염, 신장염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치료해야 하며, 만성으로 진행됐다면 꾸준한 혈액투석을 거쳐야 한다.
88흉부외과의원 임재웅 원장은 "투석은 반투과성막을 이용해 입자 크기가 큰 물질을 정제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적용한 것을 인공투석이라고 한다. 의학적으로는 반투과성막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노폐물이 많은 혈액, 한쪽에는 깨끗한 투석액을 흘려 보내 농도 차에 의한 확산으로 노폐물이 빠져나가게끔 한다. 이때 삼투에 의해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투석액의 농도를 조절해야 하며 반투과성막 역시 단백질 등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필터 역할을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급성으로 발생한 신부전은 기능 회복이 될 때까지 한두 번 정도 받으면 되지만 만성이라면 신장 이식을 하지 않는 한, 평생 투석을 진행해야 한다. 잦은 투석으로 인한 불편을 덜기 위해 동정맥루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 동정맥루는 가까이 있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투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전용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웅 원장은 전용 통로를 따로 만들어주는 이유에 대해 "인체 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혈관으로는 투석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석기를 사용해서 여과하려면 펌프 속도가 200~300ml/min 이상이 돼야 하는데 정맥은 혈관 벽이 약하고 혈류가 느려서, 동맥은 깊숙해서 찾기 어렵고 혈류가 지나치게 강해서 적용하기 어렵다. 그런 만큼 상호 보완하고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가까이 있는 2개의 혈관을 서로 연결해 통로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대부분 자가혈관을 이용하지만 이것이 약한 경우에는 인공혈관을 붙여서 연결하기도 한다. 다만 한 번 수술해서 아무 문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평소 관리를 해야 한다.
손끝으로 자주 만져보면서 자가진단을 하고, 1개월마다 혈류 측정을 하고, 3~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해야 한다. 투석 시에는 협착, 혈전증, 석회화 등으로 혈관이 좁아지기 쉬우며 좁아진 혈관은 폐색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관리가 중요하다.
투석혈관은 손상되면 수명이 줄어들게 되고, 모두 폐색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는 다시금 조성 수술을 받아야 한다. 평균 투석혈관 사용 기간은 자가혈관 5년, 인조혈관 3년 정도이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도 충분히 문제를 알 수 있다. 그런 만큼 반드시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혜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