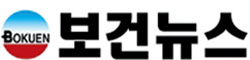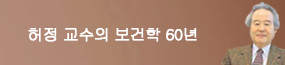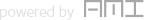인사동에 가면 옛날 고서들만 다루는 통문관(通文館)이란 책방이 있었다. 주인은 한문을 배우진 않았지만 고서를 다루다보니 옛날 책에 대한 일가견을 가진 분이었다.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 조정에서 만들어낸 내각장판으로는 오자가 거의 없는 논어나 맹자 같은 책들도 있었지만 지방에서 사사롭게 찍어낸 책들은 잘못된 것도 많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고서가 비싼 이유는 보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을 역사적으로 펴낸 김두종 박사의 얘기도 이와 비슷하다. 그가 한국의학사 외에 말년에 심혈을 기울여 썼던 한국고인쇄기술사는 거의 대부분의 자료를 일본에 가서 복사해 왔다는 솔직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빼고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고서들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벽지를 바르기 전에 초벌로 고서를 뜯어서 썼기 때문에 남은 고서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역사는 쓰는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바뀌지만 자료는 기록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개인의 기록이 역사의 주 재료가 되고 주춧돌이 된다.
동서양교섭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을 중요한 것으로 꼽는다. 이것도 따지고 본다면 마르코 폴로의 지난 행적을 기록해서 밀린 봉급을 받기 위한 개인의 기록이다. 박지원의 연암일기도 중국사신을 따라가 청나라 문물을 일기같이 쓴 기록이다. 말년에 정신문화연구원장으로 활동하신 이선근 박사의 구한말정치사는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에서 소문난 강의로 도청하는 사람들도 많아 언제나 몇백명씩 북적거렸다. 강의의 기초자료는 대부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의 개인기록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사람들의 기록이 훗날 역사의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일본에선 요새 개인사(個人史) 쓰기가 붐이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 개인사를 펴내고 있다. 그중에는 어린 나이에 소년항공병으로 자원해 가미가재(神風) 특공대로 생을 마친 사람들의 편지까지 모아서 펴내고 있다.
역사를 되돌아보고 앞날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겪어온 경험과 시련을 나름대로 기록에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창하게 자서전이란 말을 쓰고 싶지 않다. 큰 업적을 남긴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한사람의 성실한 서민으로 살다간 사람들의 발자취도 역사 만들기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본다. 나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글을 쓰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훌륭하고 값지다. 가능하다면 개인사를 남기는 것도 좋으리라 본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