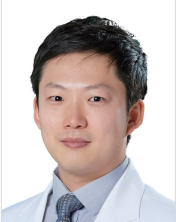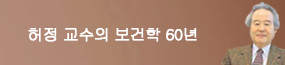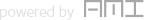의·정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왔던 의대증원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의대증원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의 최대 쟁점이었다. 하지만 국감에서 나타난 정부의 의대증원 의지는 흔들림이 없었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있는 '원점 재검토'는 현재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이 됐다.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 또한 예정된 것이어서, 의정 간 갈등을 골을 좁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보건복지부 국감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의원들의 칼날 같은 질의에 "내년 의대 증원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가 밝힌 의대 교육과정 단축안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만 않는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야당 측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또한 향후 의료계의 거센 비난을 피해갈 수는 없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불렀다. 획일적인 단축 의무화가 아닌 대학의 선택에 따른 지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교육부가 의대 교육 부실화에 앞장선다며 맹비난했다. 여기에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한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한 긴급대책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교육부 발표에 "의대교육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춘 졸속 대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정부는 의대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진정 원한다면 원점 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9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전공의 공백에 의대생 동맹휴학으로 이어진 '의료대란'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양측 주장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한 데는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정부가 빠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두를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의료계 또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아집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공적 기능을 배제할 수 없는 의료는 그 누구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제도로 발전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의 변화와 혁신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의사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의료계 한 원로의 고언이 가슴에 닿는다. 평생 보건학에 몸담았던 이 노(老)학자는 젊은 의사들을 향해 "좁은 생각으로 의사의 권익만을 따진다면 의료의 미래는 없다. 지금은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한 시기고, 이제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의사증원에 반대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김혜란 편집국장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
- 관련태그
- 데스크칼럼